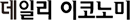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Personal Mobility)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들려오는 관련 사고 소식들 탓이다.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 인구 측면에서 전세계 2위 규모로 올라서는 등 폭풍 성장세는 거세진 반면,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 장치는 사실상 전무해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실 전동킥보드를 다룬 도로교통법 개정 당시에도 안이한 국회·정부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난 바 있다. 높아진 국민 안전의식 수준에 위정자들은 ‘개정의 개정’을 해야만 했다. 법적 미비함이 부실 내용으로 채워지는 순간이었다.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통계 집계 초기인 지난 2016년부터 2년 새 무려 5배나 증가했음에도 첫 개정 당시 만13세 이하·무면허자에게도 이용 권리를 부여했다.
결국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 끝에 지난 5월 재개정을 통해 안전헬멧 의무 착용,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 면허 소지 등을 법제화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고는 끊이지 않는다. 법·제도적 미비함이 불러온 현재 진행 중인 참사라는 혹평이 뒤따르는 이유다.
최근 경기도 수원 한 도로에서 10대 청소년·아동 두 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갑자기 튀어나와 차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문제는 가해자로 몰린 쪽이 자동차 운전자라는 점이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서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두 청소년이 탄 전동킥보드가 골목길에서 돌연 튀어나오면서 당시 서행 중이던 A씨 차량 앞부분과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이들 청소년·아동은 각각 만 12세·10세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대가 아니다. 심지어 헬멧 등 보호장구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 청소년·아동이 촉법소년이라 가해자로 A씨를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연히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업계에선 이같은 모호한 시장 운영이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데서 비롯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무분별한 사업체 난립에서 파생된 부작용으로 보고 있다.
같은 업계 내에서도 ‘스타트업일 뿐인 소규모 회사며, 여전히 시장 파이는 작다’는 등의 이유로 현 규제가 과도하다는 입장도 물론 있지만, 무려 15곳 이상의 업체가 약 10만 대를 운영하는 등 이용자 기준 전세계 2위 규모로 성장세가 지속됐다는 점에 비춰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PM 가해사고는 1년 새 2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분별하게 시장의 덩치만 키울 게 아니라 각 운영사 책임도 함께 키워 시장 성숙도를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는 배경이다.
이에 최근 업계에서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대안은 ‘허가제 변경’이다. 현 등록제인 시장참여 제도를 허가제로 전환해 전동킥보드 운영 대수를 줄이는 대신, 각 운영사의 책임성을 높이는 등 효율적 사후관리 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서비스 제공 업체의 책임성이 강화되면 사후관리에 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사후관리가 부실할 경우 시장 퇴출이 즉각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지켜져야 하는 건 두말할 필요없이 국민 안전이다.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할 만큼 성장한 국내 PM 시장이다. 이제 더 이상 이용자 안전 및 공익을 고려치 않는 운영사는 퇴출될 수 있도록 더욱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